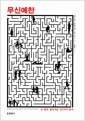 무신예찬 - 무신예찬 -  피터 싱어.마이클 셔머.그렉 이건 외 지음, 김병화 옮김/현암사 |
|
난 신이 ‘없으면 좋겠는 쪽’이다. - 『무신예찬』 서평
지금의 날 아는 사람들은 놀랄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이른바 ‘모태신앙’이었다. 날 태어났을 때부터 길렀던 외가 사람들은 모두 독실한 개신교(아마 장로회였던 것 같다.) 신자였고 나도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성경 만화 같은 건 수십권을 읽었고 집에서도 기도가 일상이었다. 당연한 일상이었던 신앙 생활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대략 10대 초중반 때부터였다. 처음 찾아온 것은 내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이었다. 나는 내가 신을 믿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내게 신앙이라는 게 있긴 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졌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본 결과, 나는 사실 내가 신과 기독교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과정은 특별한 계기 없이 서서히 진행되었다. 굳이 계기를 든다면 내가 중학교 때 여러 철학입문서들을 읽으며 나 자신과 세계에 대해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데카르트적인 방식으로 내 안에서 회의를 극한까지 밀고 나가면서 내 사유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으려고 시도하곤 했다. 내 습관화된 신앙도 그런 회의의 대상 중 하나였다. 할머니는 내가 어느 장난꾸러기 친구를 잘못 사귀어 경건한 신앙을 잃은 거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지만, 사실 그 친구에겐 아무 잘못이 없었다. 이미 신앙을 버린 나와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아 좀 떠들었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일까? 신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교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다. 경험적으로도 보편적 근거가 없었고 내적 개연성도 부실한 면이 많았다.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종교를 접해 와서 익숙해졌다는 것 외에는, 나 자신에게서 어떤 믿음도 찾지 못했고, 새로 믿음을 세울 근거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을 만하지가 않다’ 정도의 입장은 곧 적극적인 모습으로 급진화되었다. 거기엔 아마 10대 후반에 자라난 독립적 성향, 그리고 일체의 강압이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적․반항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와의 대화가 있는데, 그때 나는 “죽었는데 만약 사후세계가 있고 신이란 게 있다면 달려가서 그 신의 싸대기를 날려주겠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예를 들면 세계를 이따위로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거나, 죽은 뒤에 내 삶을 감히 심판하느니 어쩌니 하는 게 참을 수 없이 불쾌하다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었다. 지금도 내 입장은 근본적으로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조금 더 정리되고 다듬어졌을 뿐이다. 나는 신의 존재가 믿을 법하지 않다는 입장일 뿐 아니라, 만일 신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면 없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신이 있을 법하냐 아니냐의 쟁점을 떠나서, 신이 없기를 바란다. 솔직히 나는 신의 부재를 논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악의 문제’ 논리는 다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에우티프론」에서 진작 말이 나왔듯) 만일 어떤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면 애초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인간이 논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려주는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자유(설령 그것이 생물적․사회적 중층 결정의 결과물에 불과할지라도)는 불가능해지거나 위협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바쿠닌의 예를 따라, 신의 존재는 ‘악의 문제’보다는 ‘자유의 문제’와 부딪힌다고 하고 싶다. 좀 더 정리해서 적자면 이렇다. 나는 사회주의 또는 아나키즘에 영향을 받은 인권활동가로서, 원칙적으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평등한 자유’, ‘자유로운 인간들의 평등한 공동체’ 등을 바란다. 만약 인간이나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월한 인격적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개입하거나 사후에라도 판단을 내린다면, 그 존재는 우리에게 전제적 지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좋은 지배자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지배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바라는 좋은 세계의 요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옳았는지 어땠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대신 판단해버리고 심판하거나 대가를 주는 존재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은가? 활동가인 나는 그런 존재를 타도하고 세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할 텐데,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우월한 존재를 대상으로 투쟁을 하는 것은 가망도 없고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바라는 좋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내가 좀 덜 피곤하기 위해 신이 없으면 좋겠는 쪽이다.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됐든 하나님이나 알라가 됐든 그런 신은 없는 게 낫다. 인격적 의식이나 윤리적 성격이 없는 초자연적 실체? 그런 거야 있는지 없는지 진지한 탐구가 밝혀줄 일이고, 근거 없이 논의하는 건 난센스다. 그런 존재는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은 없지만,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일단은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 같다. 그럼에도 믿는단 사람을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그런데 인격적․윤리적 요소가 없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에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 『무신예찬』(피터 싱어 ․ 마이클 셔머 ․ 그렉 이건 외 지음(러셀 블랙포드 ․ 우도 슈클렝크 엮음), 김병화 옮김, 현암사)을 읽은 뒤 이 책에 가장 어울리는 비평은 나의 신에 대한 생각을 적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의 이야기를 써봤다. 『무신예찬』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신과 종교적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52명의 사람들이 쓴 50편의 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 (마이클 로즈와 제이 펠란, 그리고 피터 싱어와 마크 하우저가 글을 공저하여 필자 52명에 글 50편이다.) 여러 글들을 모아서 엮다 보니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잘 정리가 안 되어 읽기가 힘든 글에 마주칠 때도 있다. 그러나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에 여러 독자들의 각각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책에는 ‘악의 문제’, 증명 책임 문제, 우주론 문제 등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논거에 의한 유신론 반박, 생물학적 방식이나 정치․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신에 대한 관념이나 종교의 내용 분석,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 등이 주로 등장한다. 종교에 관한 개인적 체험들도 소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신이 없는 게 낫다는 견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든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든 또는 차별 없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서든 말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선, 이 책에 실린 〈불신앙을 넘어서〉(필립 키처)와 같은 글도 참고할 만하겠다. 신의 존재 여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동료 인간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사랑하는지는 중요하다. 신은 과연 거기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꼭 필요한가? 나도 그렇고, 이 책의 필자들 중 여럿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2013년 1월에 옥중에서 읽고 썼던 서평